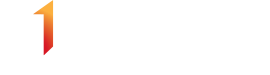오늘 포스팅은 가지급금 정리나 주식소각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이겼을 때와 졌을 때, 그 명확한 경계선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알고 설계하면, 설령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생존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판례로 보는 국세청의 승부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들, 이런 시나리오 많이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좀 쌓였네. 이거 대표자 본인 돈으로 상환하면 세금 부담이 크니, 일단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하면...현금은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가겠지? 그 돈으로 가지급금 상환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극히 ‘교과서적인 절세플랜’ 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4개의 판례를 보면, 국세청이 졌을 때와 이겼을 때의 패턴이 명확합니다. 국세청 패소 사례를 먼저 보시죠.
첫 번째로 볼 판례는 2024.9.12.에 나온 대법원 판례 (2024두24659)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그 돈을 본인이 쓰고, 대표자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이거 사실상 대표자 돈” 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자한테 돌아온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판례는 2023.7.5.에 나온 지방법원 판례 (수원지법 2022구합73353)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소각대금이 대표자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실질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봤죠.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2023.8.18.에 나온 판례 (부산지법 2023구합20578)입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각대금이 돌고 돌아 결국 대표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들어 증여 형식만 빌렸으니 세금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2023.8.10. 비슷한 시점에 나온 판례 (부산지법 2022구합58883)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소각대금이 재증여 형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승패를 가른 핵심 – 자금의 실질 귀속
판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소각대금, 즉 돈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돌아왔느냐’가 승부를 갈랐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긴 사례에서는 계좌를 추적해보니 대놓고 대표자 통장에 돈이 찍혔거나, 대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진 사례에서는 돈이 배우자나 수증자 손에만 있고, 대표자랑 금융적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증여나 소각 계획이 있다면 체크해야 할 5가지
현재 증여나 소각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5가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의 귀속 경로입니다. 소각대금이 대표님 계좌로 입금되거나 대표님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소각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서와 자금흐름의 일치여부입니다. 계약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내용이 실제 자금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중과세 여부입니다.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또 부과하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후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소각 이후 2년에서 3년간은 자금흐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주식증여와 소각을 활용하면 어떨까?”
법인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자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죠.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식처럼 대답을 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본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각하되, 소각대금은 배우자에게 들어가야 한다.”
“반대로, 배우자의 주식을 대표자에게 증여한 뒤 소각하게 되면, 가지급금 상계가 가능하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이게 항상 공식처럼 모든 사례에 딱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법의 세계에는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마다 판단이 갈리고, 입증책임도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 국세청이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돈이 대표자에게 갔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하려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방어가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장점과 리스크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 증여주식 소각 → 소각대금 배우자가 수령입니다. 장점은 소각대금이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직접 상계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과세 위험은 줄어듭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국세청이 실질과세를 들어 “실제로는 대표자의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배우자 소각대금의 사용처가 대표자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쓰였다면 국세청이 승소할 확률이 더욱 올라가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배우자 보유 주식을 대표자에게 증여 → 증여주식 소각 →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상계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대표자 가지급금과 즉시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회계나 세무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금유출 없이 장부상으로만 상계하는 경우, 국세청이 “실질적 자금 거래 없는 형식거래”라고 꼬투리를 잡기 쉽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의 패턴을 이 사례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승소 패턴:
- 자금이 대표자 계좌로 들어오거나, 대표자의 채무변제이나 투자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장부상 거래만 있고 실질 자금이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 패소 패턴:
- 자금이 배우자 또는 제3자의 계좌에 있고 대표자와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
- 이미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가 끝난 자금에 대해 대표자에게 또 과세하려는 경우(이중과세)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표자와 자금이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
- ‘대표자가 증여받아 소각 후 상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질 자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절세의 핵심은 공식이 아니라 설계와 입증의 싸움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자금의 실질흐름과 증빙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